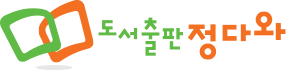보도자료
한방의 세계로 인도할 약사 '한방 길잡이', 『김수겸 약사의 실전한방강의 -감기편-』
증상별 감기를 정복하는 28가지 방제, 조문부터 치유 원리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 김수겸 | 도서출판 정다와 | 264쪽 | 정가 22,000원

약사가 한방의 원리에 대해 쉽게 풀어낸 '한방 길잡이' 『김수겸 약사의 실전 한방강의 –감기편-』이 1월 10일, 의약학 건강도서 전문출판사인 (주)동명북미디어 도서출판 정다와에서 출간됐다.
총 264쪽, 25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은 감기에 대한 증상별 28개 방제를 담고 있으며 정가 2만 2천원으로 주요 온라인 서점 및 전국 대형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책은 한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질병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과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유법을 쉽게 풀어냈다. 한·중의 한의학 역사와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기침, 콧물, 발열, 두통, 오한, 몸살, 쉰 목소리 등에 이르기까지 감기의 모든 증상들에 적합한 방제들을 각각 그 시초인 조문과 함께 기전, 구성 약재, 치유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취급하는 계지탕과 갈근탕부터 은교산, 구풍해독탕, 향성파적환 등 심화된 방제들까지 감기의 모든 증상을 이겨낼 한약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등 환자의 상태와 병의 경중에 맞춘 설명으로 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편저자 김수겸 약사는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의 전문가로 포항시약사회 한약위원장이자 한방동호회 '원펀치'의 회장을 역임하며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림생약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한림생약연구회 윤영배 선생의 강의를 통해 한방을 접하고 흥미를 느낀 뒤, 그를 좇아 한방을 공부하고 습득하며 약사로서 한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했다.
2019년 '원펀치'를 개설한 이래 꾸준히 강의하며 '약사들의 한방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방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들이 국민에게 올바른 한약 복약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여전히 공부 중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한약사가 아닌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역시 한약을 공부한다면 환자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올바른 복약지도를 해나갈 수 있다. 책은 한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약사들이 감기라는 대표적인 질병을 통해 한방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초를 깨닫고 나아가 더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한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준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한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관점과 올바른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서 소개
- 독자 대상 :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 약학대학생, 의학대학생, 한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구성 : 25개 장과 28개 방제들로 구성, 263페이지
▲계지탕▲마황탕▲대청룡탕▲갈근탕▲패독산▲쌍화탕▲쌍패탕▲소청룡탕▲맥문동탕▲청상보하환▲청폐탕▲육미▲삼소음▲갈근탕가천궁신이▲신이청폐탕▲소시호탕▲소건중탕▲시호계지탕▲시함탕▲대시호탕▲반하사심탕▲배농산급탕▲은교산▲구풍해독탕▲백호가인삼탕▲마행감석탕▲월비탕▲향성파적환 등의 증상별 방제들을 설명한다.
- 특징 :
① 한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질병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과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유법을 쉽게 풀어냈다.
② 총 25개의 장과 28개 방제들로 구성된 책은 한·중의 한의학 역사와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감기의 모든 증상을 자세하게 다룬다.
③ 감기의 증상마다의 적합한 방제들을 각각 그 시초인 조문과 함께 기전, 구성 약재, 치유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④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등 환자의 상태와 병의 경중에 맞춘 설명으로 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⑤ 약의 정보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닌 한방의 관점과 이론을 배우고 보다 심화된 한방의 세계로 독자를 입문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자 소개
김수겸
편저자 김수겸 약사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포항시에서 인성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국 약사이자 포항시약사회 한약위원장이다.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의 전문가인 편저자는 포항시약사회 한방동호회 '원펀치'의 회장을 역임하는 동시에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림생약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2010년 포항시약사회 주최 한림생약연구회 윤영배 선생의 강의를 통해 한방을 접하고 흥미를 느낀 뒤, 그를 좇아 한방을 공부하고 습득하며 약사로서 한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했다.
2019년 '원펀치'를 개설한 이래 꾸준히 강의하며 '약사들의 한방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방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들이 국민에게 올바른 한약 복약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
• 목차
인사말 04
머리말 06
1. 한의학의 역사 11
2. 傷寒과 營弱衛强 그리고 太陽病 29
3. 계지탕 41
4. 마황탕 53
5. 갈근탕 61
6. 패독산 67
7. 그 외 몸살약 77
8. 기침과 콧물 그리고 소청룡탕 81
9. 맥문동탕 99
10. 청상보하환 그리고 육미와 청폐탕 111
11. 삼소음 121
12. 갈근탕가천궁신이 127
13. 신이청폐탕 133
14. 少陽病과 소시호탕 137
15. 시호계지탕 185
16. 시함탕 189
17. 대시호탕 195
18. 반하사심탕 203
19. 인후통 209
20. 은교산 215
21. 구풍해독탕 221
22. 陽明病과 백호가인삼탕 225
23. 마행감석탕 235
24. 월비탕(월비가출탕) 237
25. 향성파적환 243
맺음말 248
• 책 소개
이 책은 한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질병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과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유법을 쉽게 풀어냈다.
총 25개의 장과 28개 방제들로 구성된 책은 한·중의 한의학 역사와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기침, 콧물, 발열, 두통, 오한, 몸살, 쉰 목소리 등에 이르기까지 감기의 모든 증상들에 적합한 방제들을 각각 그 시초인 조문과 함께 기전, 구성 약재, 치유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책은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취급하는 계지탕과 갈근탕부터 은교산, 구풍해독탕, 향성파적환 등 심화된 방제들까지 감기의 모든 증상을 이겨낼 한약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등 환자의 상태와 병의 경중에 맞춘 설명으로 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약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방의 관점과 이론을 배우고 그 원리를 깨우쳐 보다 심화된 한방의 세계로 약사들을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은 한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약사들의 '길잡이'이자 필독서이다.
• 미리보기
漢方의학서로는 먼저 黃帝內經이 있습니다. 內徑은 소문과 영추, 운기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의 사유능력은 그 시대의 사유체계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內徑시대에는 內徑시대의 사유로 한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漢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처방만 보려 하지 말고 內徑이 만들어진 시대에 과연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 內徑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內徑을 보면서도 內徑에 있는 처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內徑은 사람과 우주를 동일시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다섯 개의 원소 즉, 五行이 서로 화합하고 대립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즉, 內徑은 그 시대의 사유세계인 五行을 사람의 몸에 적용하여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五行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設입니다. 設이기 때문에 일부는 옳지만 다른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水克火를 예로 들어보면 火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火는 水 즉, 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만약 火가 촛불인 경우 물보다는 바람으로 끄니 木克이 됩니다. 기름불은 모래로 끄므로 이는 土克火가 됩니다. 五行에서 말하는 水克火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현상에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五行은 五行設입니다.
五行設은 內徑시대의 사유산물이고, 內徑시대의 사유체계가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五行設은 內徑시대의 사유체계이고 그 당시 內徑시대에 맞는 사유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시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유체계인 五行設을 공부해 內徑시대의 사고를 습득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그 당시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傷寒論과 內徑과 신농씨가 本草經을 쓰는 것이 거의 동시대입니다.
神農씨는 먹어보고 이것은 肝으로 가고, 이것은 위장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本草經에 보면 사슴이 뿔을 옆구리에 대는 것을 보고 鹿茸은 腎으로 들어가는 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적혀있습니다.
傷寒論은 최초의 임상서이고, 內徑은 이론서입니다.
內徑이후 漢方은 傷寒論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傷寒論의 저자는 장사성 태수인 장중경입니다. 傷寒論 서문을 보면 장중경이 傷寒論을 집필한 이유가 나오는데 傷寒으로 인하여 자기 일족 200명 중 70%정도가 죽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傷寒論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한론
<내경>과 <난경>과 함께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과 <본초경>(本草經)은 중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동양 전통의학의 4대 의서로 꼽힌다. 3세기 초에 후한의 장중경(張仲景)은 상한과 잡병에 관해 <상한잡병론>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경은 황건적의 난과 군웅할거 천하가 어지러웠던 후한 말 형주자사 유표가 다스렸던 형남 3군 중 하나였던 장사(長沙) 태수를 지냈던 장기(張機)의 호이다. 이는 한나라 이전의 의학 이론과 임상 경험을 계통적으로 총괄하고 질병의 치칙과 치법 및 처방 등을 다룬 것으로서 중의학의 확고부동한 토대가 되었다.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용 처방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였으므로 처방서의 원조, 즉 방서지조(祖)로 회자되며 장중경을 흔히 의성(醫聖)이라 일컫는다.
傷寒이란 風寒의 손상을 받아 일어나는 유행성 급성열병의 증상 또는 증후군을 말하는 것이나 넓게는 여러 가지 급성 전염병을 총칭한다. <상한잡병론>은 처음 16권으로 저술되었으나 전란을 겪으며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 삼국이 통일되고 세워진 진(晉)의 태의령(太醫令) 왕희(王熙: 210~280 추정, 字는 叔和)가 남아있는 <상한잡병론> 10권을 수집하고 이를 15권으로 편집하여 <금궤옥함요략방>(金櫃玉函要略方)으로 재편했다. 왕희, 즉 왕숙화는 도가사상이 널리 퍼져있던 위진(魏晉) 시대에 의술에까지 신비주의로 물들자 의학의 정통을 확립하고자 애쓴 끝에 전란으로 흩어져있던 중경의 저작을 수집하여 장중경의 이름과 업적을 후세에 전해지게 한 큰 공을 세웠다. 또한 脈診을 집대성하여 현존하는 최초의 脈學 전문 서적인 <맥경>(脈經)을 저술하여 동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로부터 숱한 세월이 지나 북송의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때에 한림학사이자 장서가(家)인 왕수(王洙; 997~1057)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한과 병과 처방이 들어있는 고의서 세 권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곧 장중경의 <상한잡병론> 고전본(古傳本)이었으며 왕수는 이를 정리(整理)하여 <금궤옥함요략방>(金賢玉函要略方)으로 이름을 지었다. 북송 영종(英宗 재위 1063~1067) 때에 임억(林億 : 생몰년 불상) 등이 구전되거나 다른 의서에 인용된 것들을 보완하고 <상한론>과 <금궤옥함요략>으로 나누어 간행함으로써 <상한론>의 명맥을 잇게 했다. 두 책에는 300여 종의 처방법과 200여 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명나라 조개미(趙開美;1563~1624)가 다시 하나로 합해 <상한잡병론> 또는 <상한졸병론집>(傷寒卒病論集)으로 만들어 전했으며, 후세에 이를 또다시 나누어 상한병을 주로 다루는 의서를 <상한론>, 기타 내과, 외과, 부인병 등의 합병을 정리한 의서를 <금궤요략>으로 칭하여 현세에 전하고 있다.
송대에 들어서 장중경의 상한론을 널리 퍼뜨렸는데 그 중 으뜸으로 꼽는 것이 주굉(朱肱: 1068~1165)의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이다. 이는 상한론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저술로 꼽힌다. 이 저서의 원 제목은 <상한백문>(傷寒百問)으로 1107년에 3권으로 저술되었고 이를 저술한 업적으로 의학박사가 되었다. 1111년에 벗 장천(張)이 서문을 쓰고 <남양활인서>로 제목을 바꾸어 발간했다. 장중경과 주굉을 일러 '의학의 공맹(孔孟)'이라 부를 정도로 주굉은 장중경 이후 8백 년이 지나 傷寒 이론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린 위대한 의가였다.
傷寒論과 內徑과의 사유체계는 서로 다른데 內徑은 五行론에 근거를 두고 설명했다면, 傷寒論은 陰陽에 따라 설명하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중경은 傷寒論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寒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陽,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陰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寒은 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하는 모든 外邪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오래 쬐 쓰러지는 일사병에서, 뜨거운 태양이 몸에서는 寒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寒은 바이러스, 꽃가루, 수술할 때의 칼, 옻나무에 접촉하는 것, 벌레에 쏘이는 것 등 내 몸에 해를 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熱이 나는 것도 수술용 칼이라는 寒이 침범해서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熱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저항하는 단계를 太陽, 少陽, 陽明으로 세분하고, 저항하지 못한 단계를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중경의 傷寒論이 중국의 의학사상을 1000년 정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중경 死後 약 1000년이 지나 李東垣에 오면 張仲景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금원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의학사상이 傷寒論을 넘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뛰어난 의학사상가를 지칭하여 금원사대가라고 합니다.
금원사대가의 첫 번째 인물로는 장자화가 있습니다.
장자화는 모든 病의 원인은 배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 치료법으로 下法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病은 사람 몸에 독소가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는 下法을 위주로 承氣湯流의 처방을 사용하였습니다. 傷寒論에 承氣湯이 있는데, 張子和는 傷寒論의 承氣湯을 그대로 끌고 와서 下法을 씁니다.
금원사대가의 두 번째 인물로 劉完素가 있습니다.
유완소는 그의 출신지인 하간을 붙여 유하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장중경이 傷寒論을 집필했다면 유하간은 雜病의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장중경은 病因을 寒으로 보았지만 유하간은 病因을 火로 보았습니다. 장중경은 三黃瀉心湯을 창방했는데 유하간은 火를 끄기 위해서는 三黃瀉心湯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黃連解毒湯을 창방하였습니다.
劉河間은 傷寒論에서 나온 三黃瀉心湯을 안 쓰고, 三黃瀉心湯을 변형시켜 大黃을 빼버리고 梔子와 黃柏을 넣어서 黃連解毒湯을 만들어냅니다. 張子和와 劉河間의 차이는 張子和는 傷寒論의 처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劉河間에 오면 三黃瀉心湯을 黃連解毒湯으로 변형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원사대가의 세 번째 인물로는 이동원이 있는데, 그 유명한 脾胃論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이동원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극에 달해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동원은 치료의 근본은 中焦를 補하는 것인데, 장중경의 傷寒論은 建中과 理中의 법밖에 없다며 建中과 理中만으로는 病의 근본을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傷寒論이나 黃帝內徑과는 다른 독자적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李東垣은 補中을 주장해서 補中益氣湯을 만들어냅니다.
劉河間의 개념에서는 三黃瀉心湯에서 黃連解毒湯으로 발전해나가는데, 李東垣에는 없던 처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치환을 한 것과 없던 처방이 만들어진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동원은 그의 학설을 인정받기 전에 죽어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금원사대가의 네 번째 인물로 주단계를 들 수 있는데 주단계로 인하여 비로소 이동원의 학설이 인정받게 됩니다. 주단계는 건강이란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라며 陰은 항상 虛하고 陽은 항상 남아돌기 때문에 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陰을 보충하고 남은 陽을 억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단계는 脾胃論에 덧붙여 치료법으로 자음강화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단계가 창안한 처방으로 滋陰降火湯이 있습니다.
張子和는 막혀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下法을 쓰고, 劉河間과 朱丹溪는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劉河間의 火法이 朱丹溪에 오면 훨씬 더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黃連解毒湯과 滋陰降火湯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劉河間이 생각했을 때는 熱 하나만 생각했는데, 朱丹溪에 오면 補陰을 시키면서 熱을 끄게 되었습니다. 滋陰降火湯을 우리말로 하면 陰虛로 인해서 虛熱이 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4세기의 사람들인데, 16세기에 오면 청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등장한 온병이론을 통해 대규모 전염병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금원사대가 이후 장개빈(장경악)이 나오는데 장개빈은 치료법으로 온보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장개빈은 內徑부터 금원시대까지의 의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자신의 의학사상을 더하여 경악전서를 집필했습니다.
장개빈은 이전 의학사상가들이 주장하는 학설들, 즉 유하간의 瀉火法, 장자화의 下法, 이동원의 脾胃論, 주단계의 滋陰降火法 등은 모두 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어떤 치료법이든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모두 맞는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病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다른 것이지 病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전 의학사상가들은 치료법을 말했으나 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원사대가와 장개빈의 각 의학사상과 학설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 의학사상가에 따라 변해온 것뿐입니다. 어느 학설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실은 모두 다 맞는 학설이 됩니다. 즉,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그 시대의 사유체계로 사람을 본 것이기 때문에 각 의학사상가의 학설은 결국 모두 맞는 말이 됩니다. 각 의학사상가의 학설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현시대에 한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학사상가들의 학설을 모두 공부하고 때에 따라서 각 이론과 처방을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이었고,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鄕藥(향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약입니다. 향약은 주로 單房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唐藥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중국에서 약제를 사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세종 때 보면 벌써 향약집성방이 있었습니다. 향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술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대주의가 팽배해지고 선조 때 허준이 東醫寶鑑을 만들면서, 東醫寶鑑에서는 鄕藥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종 때까지만 해도 향약집성방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東醫寶鑑에 오면 우리나라의 의학인 鄕藥을 東藥이라고 해 버립니다.
허준은 선조의 명을 받들어 여러 의학서들과 치료법을 정리한 東醫寶鑑을 집필했습니다. 東醫寶鑑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東醫寶鑑이 한방의 표준전과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東醫寶鑑 이후 우리나라의 韓方은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공부하게 되어 傷寒論, 脾胃論 등의 기성 한방의학서들은 그 중요도가 적어졌습니다.
동의보감은 1596년에 저술을 시작해서 1610년에 완성했고, 1799년 제중신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동의보감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종손익과 방약합편이 나옵니다. 方藥合編은 처방과 병증 중심의 내용으로 정리된 임상서입니다. 方藥合編은 지금까지의 어느 한방서보다도 많이 보급된 희대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발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의 한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傷寒論이 日本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 說은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을 것이다, 그냥 건너갔을 것이다.’라고 말은 많은데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傷寒論이 日本으로 건너가서 古方이 꽃피웁니다.
방약합편이 나오고 나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 ~ 1930년에 일본에서 古方이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日本의 古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방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古方을 받아들이고 난 뒤, 이것이 선진한방이라며 일본한방을 공부하더니 우리나라의 전통적 한방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의 사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 사설을 보면 일본에서 한약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약의 체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古方은 新학문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동양의전(경희대 전신)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의학을 끌고 와서 중국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古方 이후 傷寒論, 금궤요략과 더불어 중의학이 들어오면서 중국의학의 대부분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의학이 대세가 되었고, 古方은 쓰던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향약을 계승한 우리 전통의학은 주로 건강원에서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漢方이 東醫寶鑑으로 들어가고, 방약합편으로 빠지게 됩니다. 東醫寶鑑은 표준전과이고, 방약합편은 처방과 병증 중심으로 정리된 임상서입니다.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요약판입니다. 그래서 東醫寶鑑의 계열을 後世方계열이라고 하고, 日本의 것이 들어온 것을 古方계열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古方과 後世方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이란?
한약이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생약
의약품의 일종이며,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 그대로 혹은 말리거나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삼는 것.
한약은 개봉판매가 가능합니다!!! 덕용포장에서 덜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제형만 같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립 + 과립 = O
과립 + 환 = X